[글로벌 외식정보=진익준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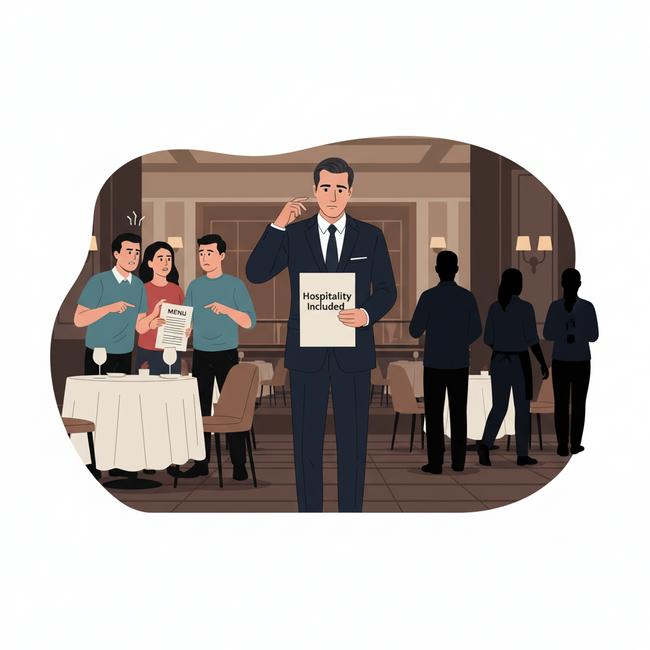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모두 '훌륭한 서비스'를 원합니다. 직원이 내 마음을 알아서 척척 챙겨주고, 불편할까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식당을 최고로 칩니다. 기꺼이 비싼 값을 내고, 심지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그 '대접'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켰던, 그 '훌륭한 서비스'를 핵심 무기로 삼았던 식당들이 어느 순간 힘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맛이 변해서? 아니면 사장이 초심을 잃고 나태해져서? 글쎄요. 그런 진부한 이유 말고요. 저는 그 '성공 요인' 자체가 사실은 그들의 발목을 잡은 '실패 요인'이 되었다는, 조금은 껄끄러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풀서비스(Full-service)'라는 화려한 Jenga 타워가 어떻게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A돼지집'입니다. 이 브랜드가 시장에 던진 충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판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고객에게서 '고기 굽는 노동'을 빼앗아, 직원의 '전문 그릴링 서비스'로 치환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까지 고깃집에서 고기 굽기는 막내나 후배의 몫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태울까 봐 전전긍긍하며 대화에서 소외되어야 했죠. A돼지집은 이 '노동'을 매장이 가져가는 대신, 고객에게 '편안한 대화'와 '최적의 맛'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더 비싼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고객은 열광했습니다. '노동 해방'의 대가로 기꺼이 지갑을 연 것입니다. 참으로 천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의 'LBM'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베이글을 판 게 아닙니다. '런던 현지의 감성'을 팔았습니다. 그 감성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국적인 인테리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활기차게 움직이며 특유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직원들의 '감성 노동'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저 예쁘장한 빵집에 그쳤을 겁니다. 고객은 그 '연극'의 관객이 되고자, 그 '분위기'의 일부가 되고자 기꺼이 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두 사례는 명백히 보여줍니다. 성공의 핵심 블록은 '상품(Pork, Bagel)'이 아니라 '인간의 서비스(Grilling, Atmosphere)'였습니다. 이 Jenga 타워에서 가장 빛나고 핵심적인 블록이었죠.
문제는 간단합니다. Jenga 타워는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며, 특히 그 핵심 블록이 '인간'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공의 기쁨에 취해 있는 동안, '인간 서비스'라는 이름의 청구서는 어김없이 날아옵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돈(인건비)'입니다.
이 모델은 태생적으로 '최저임금'과 싸워야 하는 숙명을 가집니다. 직원의 숙련된 서비스가 핵심인데, 그 서비스는 공짜가 아닙니다.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는 '풀서비스' 모델의 수익률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강타합니다. 매출이 올라도 인건비 상승률이 더 가파르면, 사장은 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꼴이 됩니다. '서비스 품질'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품질 관리(QC)'입니다.
레시피는 100%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맛'이나 '활기찬 에너지'를 어떻게 100개 매장에서 똑같이 복제할 수 있을까요? A돼지집의 1호점과 100호점의 그릴링 서비스 품질이 과연 같을까요?
'LBM'의 그 활기찬 에너지를 모든 직원이 365일 동일하게 뿜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통제 변수가 아니라 가장 예측 불가능한 '상수'입니다. 직원의 컨디션, 숙련도, 그날의 기분에 따라 브랜드 경험은 널뛰기를 합니다.
세 번째 청구서는 '확장성의 덫'입니다.
이 모델의 정점에는 '스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이 있습니다. 셰프가 곧 서비스이자 브랜드의 전부입니다. 완벽한 '풀서비스'죠. 하지만 이 모델은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셰프가 떠나면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건 '사업'이 아니라 '셰프의 직업'일 뿐입니다.
만약 어설프게 시스템화(매뉴얼)를 시도하면, 앞서 말했듯 QC 실패로 브랜드 가치가 희석됩니다.
'LBM'처럼 직영으로 확장을 감행하면, 소수 정예 인력의 노동 강도가 한계치를 넘어섭니다. 최근 들려온 비극적인 소식(직원의 과로사 논란)은, '사람을 갈아 넣어' 유지되던 이 화려한 모델의 슬픈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딜레마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비스'라면 성경처럼 떠받들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뉴욕의 전설적인 레스토랑 경영자, '대니 마이어(Danny Meyer)'입니다. 그는 '환대(Hospitality)'라는 철학으로 유니언 스퀘어 카페, 그래머시 태번 등을 성공시킨, 말 그대로 '서비스의 왕'입니다.
그가 2015년에 거대한 실험을 합니다. 이름하여 '팁 폐지(Hospitality Included)'. 팁 때문에 발생하는 주방(BOH)과 홀(FOH) 직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직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주겠다는 고귀한 실험이었습니다. 대신 메뉴 가격을 20~25% 올렸죠. '풀서비스'의 비용을 고객에게 투명하게 청구하겠다는, 가장 정직하고 완벽한 '풀서비스' 모델의 시도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0년, 그는 이 실험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팁 제도로 복귀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고객과 직원 모두의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고객들은 가격표에 모든 비용이 포함된 '정직한 가격'보다, 팁을 통해 자신의 '서비스 통제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가격'을 선호했습니다. 유능한 홀 직원들은 팁을 받을 때보다 수입이 줄어든다며 떠났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비스의 왕'조차도 '풀서비스'의 비용을 시장과 고객에게 온전히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동네 고깃집 사장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K-근성'으로 직원을 더 쥐어짜고, 사장이 잠을 줄여가며 버티는 것?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해법은 '풀서비스'라는 Jenga 블록을 핵심에서 들어내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그 해법 역시 '대니 마이어'가 보여줬습니다. 그가 만든 또 다른 브랜드, 바로 '쉐이크쉑(Shake Shack)'입니다.
쉐이크쉑은 '파인 캐주얼(Fine-Casual)'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는 '파인 다이닝(Full-service)'에서 얻은 핵심 가치, 즉 '최고의 원재료'와 '존중의 조직 문화'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변수인 '인간의 풀서비스'는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대신 '카운터 서비스'라는 완벽한 '시스템'을 도입했죠.
고객은 최고의 햄버거를 경험하지만, 그 과정에 인간의 감정 노동이나 숙련된 기술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이 쉐이크쉑이 전 세계로 그토록 빠르고 동일한 품질로 확장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서비스'가 아닌 '시스템'이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풀서비스'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람의 손'과 '감성'에 의존하는 Jenga 타워를 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공하는 순간부터 무너질 운명을 안고 태어납니다.
대신, 레시피, 프로세스, 시스템이라는 단단한 '피라미드'를 쌓으십시오. '서비스'는 그 피라미드 위에 올리는 화룡점정의 '장식'이어야지, 기둥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건비 폭등과 인력난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당신의 배를 침몰시키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