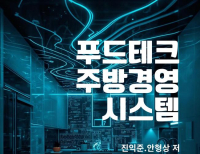[글로벌 외식정보=진익준 ]
“990원 소금빵.” 단순한 숫자가 던진 파장은 컸다. 유튜버 슈카가 내놓은 이 이벤트는 며칠 만에 매장 앞 긴 대기줄과 수많은 SNS 인증샷을 만들어냈다. 한 언론은 “비싼 물가 시대, 소비자 구원자 등장”이라 표현했고, 일부 네티즌은 “백종원 이후 가장 착한 장사”라고 추켜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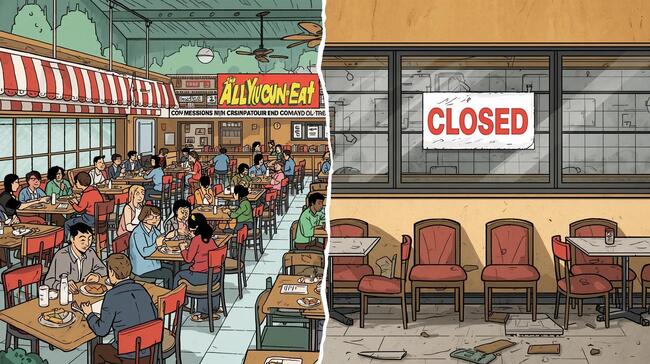
언론은 가격을 단순화해 서사를 만든다. “싼 곳은 선, 비싼 곳은 악.” 하지만 빵 한 개의 가격에는 밀가루·버터 같은 원재료비뿐 아니라 임대료, 인건비, 숙련 노동, 브랜드 철학이 녹아 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소금·버터 등 주요 제빵 원자재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2% 상승했다. 여기에 서울 주요 상권의 월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가격만으로 ‘착함’을 규정하는 순간, 좋은 재료를 고집하며 정직하게 가게를 이어온 빵집들은 졸지에 폭리업자가 된다.
슈카는 361만 명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다. 영상 하나만 올려도 수십만 조회수가 보장되고, 그 자체가 홍보다. 일반 빵집이 수백만 원을 들여도 얻기 힘든 노출 효과다. 실패해도 감당할 자본력이 뒤따른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동네 제과점의 월평균 매출은 약 2,500만 원. 인건비·임대료·재료비 등을 빼면 실제 순이익률은 10% 남짓이다. 하루 수백 명을 끌어모을 수 있는 ‘셀럽 빵집’과는 애초에 게임의 조건이 다르다. 이는 마치 헤비급 선수가 아마추어 복서와 같은 링에 서는 것과 같다. 소비자에게는 볼거리지만, 동네 가게에겐 생존을 위협하는 출혈경쟁이다.
가격 파괴는 소비자에게 단기적 즐거움을 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몰아넣는다.
예컨대 2023년 한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가 ‘5,000원 치킨’을 내놨을 때, 일주일 만에 매출은 급등했지만 두 달 후 재료비 압박으로 매장 절반이 가격을 다시 올렸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착한 가격’의 지속성을 얻지 못했고, 주변 치킨집들은 출혈경쟁 후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빵집도 마찬가지다.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면 원재료의 질을 타협하거나,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이는 곧 음식의 질 저하와 종사자 노동 환경 악화로 이어진다. 다양성은 사라지고, 저가 프랜차이즈나 단기 이슈몰이 가게만 남는다. 시장의 풍요로움은 결국 소비자 손해로 돌아온다.
슈카의 소금빵은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였을지 모르지만, 시장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언제부터 ‘가격’ 하나로 가게의 착함을 재단하게 되었을까?
진정한 ‘착한 가게’는 단순히 값싼 가게가 아니다. 좋은 재료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직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며, 자신만의 철학으로 시장의 다양성을 지켜내는 곳이다. 소비자 역시 최저가만 찾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내는 값이 누구의 노동과 어떤 가치에 쓰이는지 묻는 감각이 필요하다.
싼 가격이 착한 게 아니다. 가치를 지켜내는 가게가 진짜 착한 가게다.